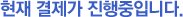도예가, 회화 작가
조던 콜론(Jordan Colon)의
브루클린 갤러리 탐방
조던 콜론(Jordan Colon)은 미국 브루클린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도예가이자 회화 작가이며 전직 팜투테이블(farm-to-table) 레스토랑 오너쉐프이다. 2월의 어느 겨울날, 작가의 옛스런 정취가 풍기는 자택을 방문하여 그의 작품, 정신세계, 고향 펜실베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필자는 또한 브라질 원주민들의 공예품과 콜론의 다양한 도자기 콜렉션을 상설 전시하기 위해 콜론과 인코우자(Incausa)가 공동 설립한 노블쇼룸(Noble Showroom)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콜론은 ‘미니멀리즘'이란 단어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은 질색한다며 그는 운을 뗀다. “너무 흔히 또 자주 오용되는 단어죠, 모더니즘처럼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가는 긴 포플러나무 테이블 위의 회색 도자기 컵을 예로 든다. 그의 손가락이 가르키는 곳을 보니 유약을 바른 위로 보라색 줄무늬 같은 것이 보인다. 너무 연해서 첫눈에는 절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이다.
“이 안에 새로운 은하가 펼쳐져요, 복잡미묘하고 여러가지 관점을 제공하는. 미니멀리즘이라고 간단히 정의해 버리기엔 아깝죠.”
그럼 그의 작품을 달리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는 질문에 그는 ‘소박함'이라고 답한다.
그의 도예 작품과 마찬가지로, 콜론의 옛스런 브루클린 자택도 그가 “도시 한복판의 시골집"이라 애정어리게 칭할만큼 소박함의 정서를 담뿍 담고 있다. 직접 빚은 인센스 홀더에는 세이지 향이 피어오르고, 창문 밖 따스한 오후 햇살은 눈 덮인 지붕을 넘어, 침실 옆에 위치한 콜론의 작업실까지 넘실댄다.
이 브루클린 예술가의 “시골집”에 깃든 그의 고향 펜실베니아의 정취 역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필자 앞에 놓인 테이블은 맏형 조나단(Jonathan)의 작품이고, 벽에는 다른 형제 조쉬(Josh)의 아트북으로 가득 찬 책장이 매달려 있다.
콜론은 5남1녀의 대가족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목공업에 종사하였고, 어머니는 ‘현대여성'이 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전업주부로 살며 아름다운 퀼트를 제작했다고 한다.
콜론이 예술가가 될 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자라면서 자연스레 터득한 것이었다. 콜론은 그의 맏형 조나단이 그 동생들이 따를 예술의 길을 소위 ‘개척’했다고 말한다. 펜실베이나 랜캐스터(Lancaster) 지역의 각종 미술대회에 형제끼리 우루루 참가하여 상을 휩쓸어 오곤 했던 추억이 그에게는 그저 정겹다.
많은 이들이 그를 도예가로 알고 있지만, 콜론의 첫 매체는 회화였다. 10대의 그는 합판으로 대강 마감된 다락방에서 밤새 음악을 들으며 절친들의 인물화를 그려대곤 했다.

콜론의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회화 작품들은 앞서 언급한 노블쇼룸에서 볼 수 있다. 작가의 자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 갤러리는 정적이며 여백의 미를 추구한다. 입장과 동시에 코끝에 와닿는 팔로산토 인센스의 향이 관객을 압도하며 전시 관람 내내 함께한다. 브라질 원주민 부족이 만든 가면들이 벽면을 차지하고, 수제 바구니와 콜론의 도예 작품들은 미술관에서처럼 단정히 선반 위에 전시되어 있다.
회화와 도예 외에 또 한 가지 콜론이 사랑하는 것은 요리. 2006년 브루클린으로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Eat”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열었다. 이 비건 레스토랑은 “브룩클린의 섬세한 예술가들을 위한 일종의 실험”이었다고 콜론은 회고한다.
로컬푸드만으로 만든 요리를 내는 Eat의 운영은 정치적이자 반소비주의적인 운동의 일환이었다. “아름다움과 목적의식, 그리고 연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무엇인가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2014년에 콜론은 도예에 더 집중하기 위하여 Eat의 문을 닫게 된다.
이제 도예는 그의 주요 생계수단이 되었지만 콜론은 한 가지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다. 회화 작업도 진행중이고 친구들과 같이 음악도 한다. 미술관에도 가고 소묘에도 열심히다. 콜론은 배우기를, 또 연습하길 멈추지 않는다. 각각의 다른 매체가 가진 가능성의 한계를 초월하고 싶다.

콜론에게 있어 회화는 그의 작품세계로 색채를, 또한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과 지각”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편이며 도예는 흙을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도기로 빚어내게 해주는 수단이다.
창의적 표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함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 콜론은 이렇게 말한다.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매체마다 주는 느낌이. 하지만 무언가를 만들어 낼 때 느끼는 영적인 충족감은 공통적이에요.”
해가 저물고, 지붕을 덮고 있던 눈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에서야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작품세계를 영적이라고 부를 순 있겠죠. 근데 물질적이기도 해요. 결국 흙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영적이라는 건 어디에든 있어요. 제 삶의 모든 곳에, 그리고 또 제 작품 속에도요.”
에디터: 텐진 사공(Tenzin Tsagong)